원작을 영화화한 [레벤느망]을 본 탓에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읽었다. 임신 중단이 법으로 금지된 시절에 23살의 대학생이 홀로 겪는 다중의, 다단계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영화로 보았기에 활자를 통해 다시 보면서 나도 모르게 영화와 소설의 싱크로율을 확인하는 데에도 신경이 많이 갔던 것 같다. 각색 때문인지 기억하고 있는 영화의 내용과 소소한 차이는 있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영화보다 확연히 비대하고 지배적인 작가 자신의 사유와 자아의 비중이었다.
1999년의 작가가 1963년의 사건을 서술하는 내용과 동시에, 중간중간 ( ) 안의 단락들에는 1963년을 기억하고 추적하고 회상하며 기록하기 위해 애쓰는 1999년의 작가의 결의와 단상과 부연과 후일담 등이 배치되어 있는 글은, 흡사 27년의 세월을 건너 마주한 하나의 자아의 대화 같기도 하지만 지극히 자신에게 몰두하는 기록자의 내면을 그대로 옮긴 과잉 담화처럼 느껴졌다. 작가의 기록이 당혹스러울 만큼 솔직하고 모두에게 거리를 둔 것이기 때문에, 또 책이 나온 지 이미 20년이 넘게 흘렀고 그가 지독할 만큼 자신의 이야기에 천착하는 작가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면서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맥락과 의미를 환기하게 되지만 말이다.
자신의 경험은 물론 내밀한 욕망, 속물성,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기분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감정을 자기검열 없이 거의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실은 다들 그렇게들 살아가지만 타인의 시선 안에서는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는 듯 보이고 싶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한 사람의 지평을 사회적으로 확장하는 느낌이었다. 단지 씀으로써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하나의 세계가 구축되는 것이 기록의 당연한 속성이겠지만, 책을 읽으며 유독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
아주 오래 전 선물 받아 [단순한 열정]을 큰 감흥없이 읽은 후 오랜만에 작가의 책을 읽었는데, 몇몇 문장들(41쪽 “나는 이렇게 쓰기를 망설인다.”, 75쪽 “나는 말로 표현 못 하는 지성에 취해 있었다.” 등)이 반짝이며 다가왔지만(이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번역본의 한계, 원문을 읽지 못하는 나의 한계를 새삼 떠올릴 수밖에 없다. 문장은, 어쨌든 번역자의 문장이니까.), 전반적으로 나와 잘 맞는 작가는 아닌 것 같다고 느꼈다. 짧은 책이지만 미주가 적지 않았는데, [원주]로 표기한 걸 제외하면 옮긴 이의 노력인 것 같고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작가가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했거나 ‘파사주 카르디네’처럼 함의를 담은 단어에 대한 설명은 고마웠다.
노벨문학상 수상보다는 작년 부국제에서 본 그의 다큐가 꽤 좋았어서 읽어보려 사둔 [여자 아이 기억]이 엄청나게 좋지 않는 한 나와 그의 책 인연은 세 권으로 마무리될 것 같다. 자전적인 기록의 외연이 확장되고 독자에게 전달되는 반향과 세계와의 화학작용을 인정하지만, 엄청나게 좋아하는 게 아닌 한 누군가의 온갖 경험과 머리와 마음 속 갖은 필터 없는 사유와 표현들을 이렇게까지 섭렵하듯 접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시기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실은 가끔 스스로에 도취된 듯한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표현들에서는 뜨악함이 느껴졌고 두어 번 반복되면서는 좀 피곤하다고 느꼈다.
아니 에르노•윤석헌 옮김
2019.10.18.1판1쇄 222.10.11.1판4쇄펴냄, (주)민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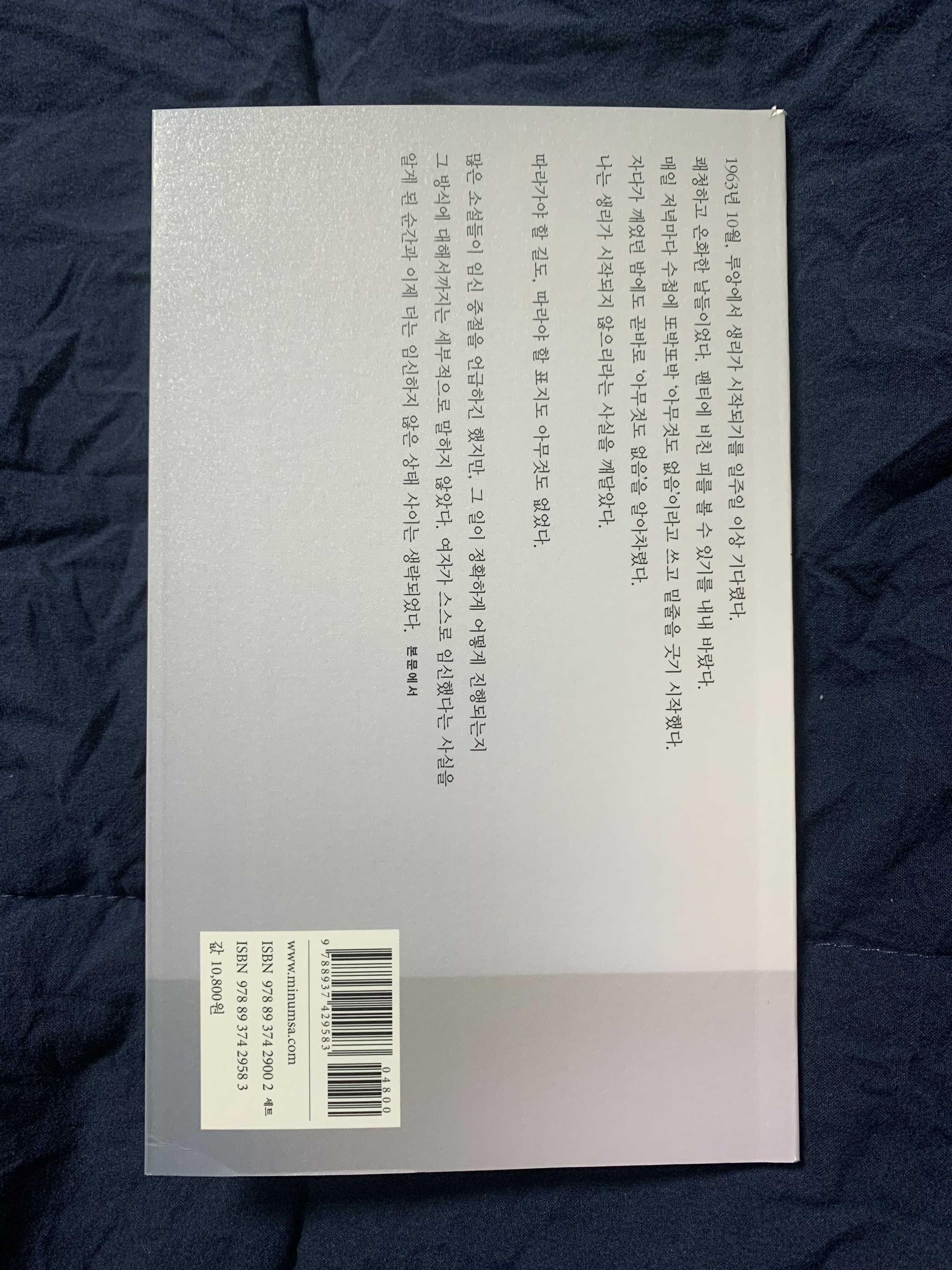
'비밀같은바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통 일베들의 시대] (0) | 2023.05.14 |
|---|---|
| [여자 아이 기억] (0) | 2023.05.09 |
| [에이징 솔로] (0) | 2023.04.22 |
|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 (0) | 2023.02.21 |
| [뾰족한 마음] (0) | 2023.02.16 |
